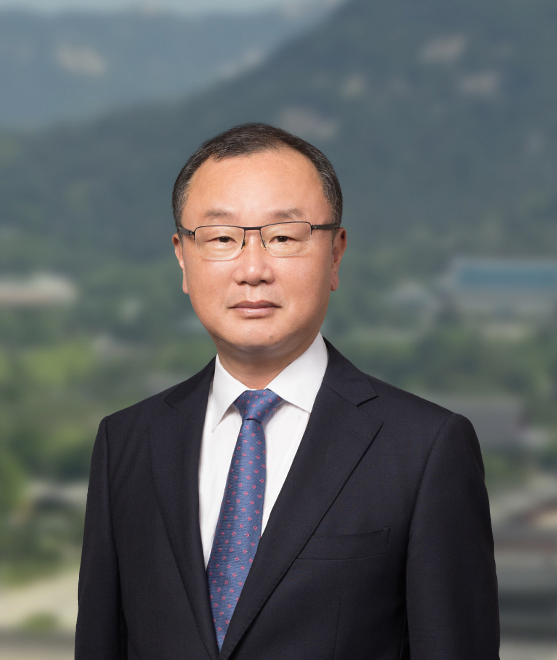[형사칼럼] 자치경찰제도 시행 후 달라진 것은
작성자 : 박상융 변호사
문재인 정부 들어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되었다. 경찰의 생활안전, 교통 등 업무가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었다. 각 도, 광역시 단위에 지방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되고 운영중이다.
필자는 변호사로서 지방시 단위 자치경찰위원회를 방문하였다. 전에 지방경찰청장 후 퇴직한 전직 출신 고위간부가 자치경찰위원장으로 재직하였다. 사무총장(국장)도 경찰 총경 출신이다.
특별히 하는 일이 없었다. 자리만 지키고 있는다는 느낌이 들었다. 당초 지방자치경찰위원회 발촉 취지와는 달리 특별히 하는 일이 없었다. 지방경찰청장 인선 관련 명목으로 시, 도지사의 동의를 받는 정도였다. 인사권도 없었다.
예산지원 관련 지방경찰 사무와 국가경찰 사무 간의 다툼이 조금 있었을 뿐이다.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다. 그러다 보니 지방자치단체 위원장들도 이런 식의 자치경찰위원회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불만을 토로한다.
일선 지구대, 파출소, 수사형사 인력은 부족한데 지방자치경찰위원회 사무인력은 늘어난다. 이태원참사 사건 등과 관련 서로 내 업무가 아니라고 발뺌을 한다.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지구대, 파출소, 읍면동사무소, 구청, 시청 등과 통합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시, 군, 구 단위 시청, 군청, 구청 건물은 호화스럽기 짝이 없다. 그에 비해 경찰서 건물은 아직도 오래되었다. 경찰서 위치도 버스 등 대중교통이 이용하기 어려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지구대, 파출소 인력은 부족하고 빈 치안센터, 파출소도 있다. 경찰이 부족하다 보니 건물관리도 허술하다. 그에 비해 시, 군, 구 단위 주민센터, 행복복지센터, 읍면동사무소는 복지시설 등 건물 시설이 좋다. 일과시간 후에는 사람이 없다.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와 통합운영해도 된다.
한 곳에서 업무를 모두 보면 주민들도, 공무원도, 경찰관도 편리하다. 특히 민원실 관련 업무는 모두에게 편리하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자치단체 입장에서 악성민원 관련 위협으로부터 파출소, 지구대 경찰관이 보호해줄 수 있다.
경찰도 관내 노약자, 장애인 등 치안취약 주민들에 대한 다양한 현장정보 수집도 가능하다. 지방자치 공무원과 경찰관의 합동 현장탐방, 찾아가는 맞춤 치안행정서비스도 가능하다. 자치단체의 다양한 직원복지시설을 경찰관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 좋지 않을까. 필자는 경찰청, 지방경찰관서와 구청, 시청 등 지자체 공무원 간 파견교환 근무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재난재해, 사건사고 예방활동, 교통소통, 사고 나아가 집회시위 관련 협력도 필요하다.
이제 행정은 찾아가는, 함께하는 행정이다. 무늬만, 모양만 지방자치경찰위원회로 하지 말고 내실 있는 활동을 했으면 한다. 교통, 방범 등 유사업무는 통합운영하자. 교류협력 인사도 추진하자.
재난재해 관련 소방, 군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근무도 필요하다. 시뮬레이션 등 훈련도 필요하다. 범죄예방 관련 방송국 운영도 필요하다. 유튜브, 쇼츠 등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다. 주민들의 입장과 시각에서 하여야 한다.
고위경찰관 퇴직자들의 자리만들기, 지방자치단체 위원장과의 친분을 이용한 자리만들기식, 보여주기식 지방자치경찰위원회는 확 바꾸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현장에 문제가 있다. 주민들과 현장경찰관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