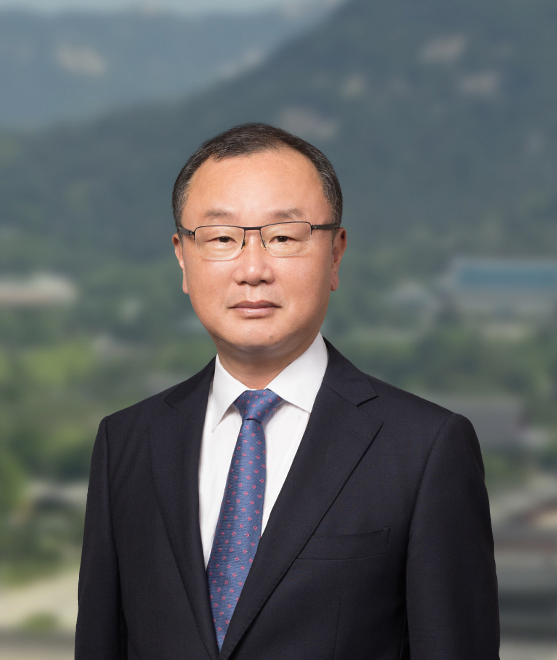[형사칼럼] 가정 관련 사건 변론 단상
작성자 : 박상융 변호사
아버지가 찾아왔다. 아들이 무섭다는 것이다. 아들이 경찰서에서 갑자기 조사를 받았는데 어떻게 처리가 될 지 모른다는 것이다. 경찰관도 자세히 이야기해주지 않는다. 아들은 죽고 싶다고만 한다. 자살 이야기만 한다.
변호사에게 물어봐도 답변을 하지 않는다. 그 동안 아들에게 무심했던 것으로 인해 아들과의 대화와 소통이 차단되고 그 상태에서 아들은 철저히 고립화된 것 같다. 정신병력 내역도 있다.
경찰조사를 잘 받을 지 걱정도 된다. 아버지가 무서우니 아들을 동행했다. 첫 만남에서 아들의 눈초리가 매서웠다. 변호사인 나 자신도 무서웠다. 아버지조차 무서워하니 말이다.
우선 들어주었다. 자신의 성장사부터 들어달라는 것이다. 사건 관련 대화는 나중 문제였다. 아버지는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대신 다그친다는 것이다. 들어주었다. 횡설수설해도 들어주었다.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정신과 검진부터 받자고 했다. 혼자 가기가 그러니 아버지도 같이 가라고 했다. 아버지 또한 아들과의 소통, 대화 부재로 정신질환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밥을 같이 먹고 차도 같이 마셨다.
이 모든 것이 변호사 일과시간이 끝난 후에 이루어졌다. 아버지와 아들 간에 모처럼 대화시간을 가졌다. 식사 후에 청계천 산책도 시켰다. 처음 경직되었던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이 한결 부드러워졌다.
수사도, 조사도 그렇게 했으면 한다. 조사를 마친 후 수사관과 차 한잔을 했으면 한다. 수사과정에서 경직된 분위기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궁금했던 사항도 들어주고 연락도 하라면서 수사관의 명함도 주었으면 한다.
수사 접견시 보니 10월부터 종이조서가 없어지고 디지털로 대신한다고 한다. 그래도 수사관의 업무가 많다. 핵심사항만 조사하면 되는데 불필요한 질문이 너무 많다. 그러다 보니 수사관이나 조사받는 사람이나 문답식 조서작성에 힘이 든다.
문답식 조서가 없어지고 수사보고 형식으로 대체하면 조사가 빨라질 것이다. 조사 후에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앙금도 풀었으면 한다. 수사관도 피조사자가 될 수 있다.
더불어, 수사관은 조사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주었으면 한다. 수사관 자신의 말보다는 조사받는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조서에 남겨두어야 한다. 그래서, 필자는 조서 말미에 “마지막으로 더 할 말이 있는지요”라는 질문에 종이를 달라고 해서 하고 싶은 말을 다 기재하라고 한다.
수사관의 가장 큰 덕목은 잘 들어주는 일, 경청과 배려가 아닐까. 아니, 경청과 배려는 가정, 사회, 직장에서도 필요하다.